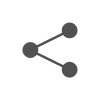1. 선택적 정의
영화 1987에 나왔던, 사회적 정의에 항거하여 최루탄 앞에 어깨를 나란히 하던 SKY의 대학생들은 어디에 있나. 법무장관 딸의 입학에 날을 세우며 손에 들었던 촛불은, 같은 기간 찜통같은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의 청소 노동자에게는 왜, 왜 비추어지지 못하는가. 그들의 정의감은 고작 자신들이 획득한 사회적 고지대에 부자격자(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한 명이 속해 있다는 것에만 반응하는, 눈멀고 입을 가린 선택적 정의일 뿐이다. 이땅에 진짜 낮은 자, 절박한 부당함에 노출된 자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는 외칠 힘도 상황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향하지 않는, 한줌의 값어치밖에 갖지 못하는 촛불이다.
2. 교회가 졌다
결국 그리 되었다. 세습은 정당한 것으로 포장되었다. 거대 교회 하나의 이익을 위해 왜곡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교단의 체면, 군소 교회들의 작은 이익은 명성교회라는 돈과 권력의 그늘에 세를 들었다. 세상의 평범하고 건강한 상식으로 보아도 비난받을 세습이, 성경의 온갖 용어로 치장되어 거룩의 탈을 썼다. 그 교회의 잘못이라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하면 그만이려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에클레시아적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은 명성교회의 망함이 아니다. 예장 통합의 망함도 아니다. 기독교의 망함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망함이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는 양심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옳음을 찾아 교회 문을 두드릴 것이며, 누가 교회의 진리에 대한 교회의 말에 관심을 갖겠는가?
3. 욕심이 이겼다.
두 사건을 잇는 공통점이 보인다. 욕심.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돈과 권력을 지키려는 욕심. 대학 캠퍼스 위에서 웃고 있는 욕심이 보인다. 십자가 첨탑 위를 뒤덮고 있는 욕심이 보인다. 이긴 것은 욕심이다. 나를 포함한,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이겼다.
나에게도 욕심이 있다. 누가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각자는 자신을 돌아보아야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라’는 프레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가 면죄부를 얻었던가. 나를 포함하여 모든 이가 자신을 점검해야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불의에, 사회적 불의에 민감함을 잃지 말아야한다. 자신’만’ 돌아보는 좁은 범위의 묵상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과 세상의 공의 둘 다를 놓치고 말 것이다.
4. 보는가 못보는가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인솔하여 식당으로 갔다. 아이들은 배식대 앞에서 차례대로 음식을 받아 자리로 갔다. 평소처럼 나는 교사용 배식대에서 식판을 들었다. 그순간, 내가 욕심의 기득권 앞에 선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음식을 주는대로 먹는다. 나는 먹고싶은 만큼 먹는다. 돼지고기김치찜을 원하는 만큼 받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 김치를 조금만 받는 것 불편함을 느꼈다. 교사용 배식대 앞에 선 짧은 순간에 나는 내 욕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작은 기득권을 가진게 아닐까.
가을스런 날씨가 짙어가지만 아이들이 가득한 낮시간의 교실은 아직도 덥다. 더위에 답답해하며 선풍기를 끄지 못하는 아이들. 체육이라도 하고 나면 교실의 공기는 땀을 머금고 텁텁해진다. 그럴때 나는 가끔씩 학년연구실로 피신한다. 거기에는 언제나 켤 수 있는 에어컨이 있다. 얼음이 가득한 냉장고가 있다. 더워하는 아이들을 두고 나는 시원함의 욕심을 부릴 방법을 혼자만 누리곤한다. 늘 그래왔던 일. 그리 큰 것도 아닌 일. 앞의 두 사건으로 예민해진 탓일까.
그렇지만 욕심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촛불을 든 대학생들이 스스로 기득권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였을까. 명성교회는 자신이 욕심을 부린다고 여겼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논리와 정당성으로 무장하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신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핵심이다.
나는 스스로의 욕심을 보는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보는가.
오늘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욕심을 보지 못하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댓가는 안타까운 영혼과 힘없는 사람들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